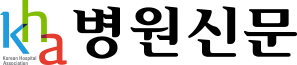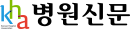지난 2003년 이후 2년만에 보는 태국산 공포영화 "셔터"(Shutter)가 30일부터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의 주를 이루는 공포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이다. 주인공 턴(아난다 에버링햄)은 20대 중반의 사진 작가. 여자친구 제인(나타웨라누크 통미)의 차를 타고 대학 동창회를 다녀오던 길에 두 사람은 한 여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낸다. 순간 두 사람은 두려움에 뺑소니를 치고 만다.
이후 이들에게는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 귀신은 이들의 꿈에서 혹은 현실에서 자꾸 나타나고 결국 턴이 찍은 사진에도 등장한다. 더욱 두려운 것은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 보지만 이 도로에서는 어떤 사고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던 중 동창들은 겁에 질린 채 한명씩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을 한다.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는 턴과 제인. 이상한 물체들이 등장했던 사진 속의 장소를 찾아가며 귀신이 품고 있는 원한의 이유를 좇기 시작하고, 끔찍한 과거가 점점 실체를 드러낸다.
암시와 반전, 현재와 과거가 촘촘하게 얽힌 채 전개되어 나가던 영화는 후반부 끔찍한 반전을 향해 치닫는다.
사실 카메라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가 아닌 까닭에 이를 이용한 공포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귀신의 뻣뻣한 움직임이나 귀신이 가진 원한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전설의 고향"식 줄거리의 흐름도 아시아 공포물의 전형이라고 할만큼 흔하다.
하지만 영화가 전해주는 소름은 카메라라는 소재나 줄거리의 반전 자체보다는 충실한 기본기를 갖춘 연출에서 나온다. 영화는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에피소드와 공포를 만나게 되는 배우들의 그럴듯한 리액션을 통해 공포영화의 정석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던 중 관객들의 공포는 점점 쌓여간다.
대략 다음 장면이 예측가능하면서도 관객의 입에서 여전히 비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예측의 순간과 비명이 터져나오는 찰나의 간격이 좁기 때문이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예측이 가능해서 더 싫은 이 영화의 공포는 적절한 줄거리 비틀기와 이를 이용한 유머로 한층 더 매력적이 됐다.
신예 반종 피산다나쿤과 팍품 웡품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태국에서는 지난해 개봉한 자국 영화 중 가장 좋은 흥행성적을 올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