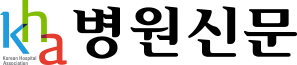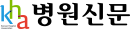명배우 로버트 드 니로의 두 번째 연출작
명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브롱크스 테일"(1993)에 이어 두 번째로 메가폰을 잡은 영화 "굿 셰퍼드"(원제 The Good Shepherd)는 미국중앙정보국(CIA)을 소재로 한 첩보스릴러다.
냉전시대에 활동했던 실존 CIA 요원 제임스 앤젤튼을 모델로 CIA의 탄생과 함께 국가를 위해 개인적 삶을 희생해야만 하는 비밀요원의 기구한 삶을 사실적이고 비정한 색채로 그렸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제작진과 출연진의 화려한 면면으로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인 에드워드 윌슨 역의 맷 데이먼과 그의 부인 역을 맡은 앤젤리나 졸리뿐 아니라 알렉 볼드윈, 조 페시, 윌리엄 허트, 마이클 갬본 등 1급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으며 "대부" 시리즈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제작자로 참여했다. 시나리오는 "포레스트 검프"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에릭 로스가 맡았다.
대부분의 첩보스릴러가 오락성이나 화려한 액션에 무게를 두는 것과 달리 "굿 셰퍼드"는 국가를 위한 대의명분과 개인적 삶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CIA 비밀요원의 인간적 고뇌와 CIA라는 조직의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한층 심각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의 배경은 대(對) 쿠바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1961년의 CIA.
카스트로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쿠바의 반(反)혁명군 지원에 나섰던 미국 정부는 CIA 내부 첩자로 인해 비밀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게 된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CIA는 내부 첩자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CIA 초창기부터 첩보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요원 에드워드 윌슨(맷 데이먼)에게 익명의 녹음 테이프와 흑백사진이 전달된다.
첩자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이 증거물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윌슨은 자신의 CIA 활동을 거슬러 올라간다.
1939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바 있는 명문가 출신 예일대 학생 에드워드 윌슨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일대의 유서깊은 비밀 동아리 "해골과 뼈(Skull and Bones)"에 가입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날카로운 사고와 좋은 평판, 그리고 미국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높게 평가받은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CIA의 전신인 OSS에 뽑힌다.
그 무렵 "해골과 뼈"에서 만난 친구 여동생 클로버(앤젤리나 졸리)와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낸 윌슨은 클로버가 임신하자 책임감으로 그녀와 결혼한다.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가로부터 첩보임무를 부여받고 유럽으로 발령받은 윌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스런 유럽 한복판에서 영국과 소련의 비밀요원들과 교류하며 CIA 비밀요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간다.
그러나 윌슨이 엘리트 비밀요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면 갈수록 음모와 배신으로 점철된 첩보세계에 대한 그의 불신은 깊어만 가고 태어난 아들조차 보지 못하고 처자식과 멀리 떨어져 일에만 몰두하는 그에 대한 부인과 아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영화는 애국심과 국익이라는 대의명분에 파묻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희생해야만 하는 CIA 첩보원의 인간적 고뇌에 카메라의 앵글을 들이댄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온갖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CIA라는 조직의 비도덕성과 폭력성도 여과 없이 조명한다.
비정한 진실을 미화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 같은 연출 의도는 드 니로가 자신의 오랜 영화적 동지이자 스승인 코폴라와 마틴 스코세이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려 167분이라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그다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드 니로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진정성이 충분히 투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기존의 오락성 짙은 첩보영화 스타일에 익숙해있는 관객이라면 지나치게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굿 셰퍼드"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19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