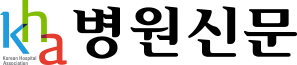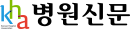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하는 것이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수익적인 면에서 좋아 의사들이 개원으로 몰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도권에서 외과 수술 위주의 병원을 운영하는 한 병원장의 한숨섞인 푸념이다.
의료사고에서 벗어나 마음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수익성까지 꿰찰 수 있는 조건을 선호하는 의사들을 비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이 너무 척박하다.
인턴을 포함해 4∼5년간 쌓아올린 노력을 포기하고 전공하지 않은 분야로 발걸음을 돌리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가를 조금 올려주었다고 해서 의사들의 좌절감을 달래주고 불투명한 미래에 인생을 걸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
지금의 의료상황에 실망한 의료계 일부에서는 전공을 포기하는 것을 현명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들을 제때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던 병원장은 이제는 체념을 떠나 이러한 시대풍조를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제도와 정책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와 의료이용량을 곱하면 진료수가가 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고정값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제외하면 변동값은 의료이용량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나 병원으로서는 환자 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가 회복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응급사고나 필수의료의 의료인력난을 해결한다고 정책수가를 올려주어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환자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료사고특례 법제화 추진도 신통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6일 마감된 2024년도 전공의 모집결과에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조차 필수의료과목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걱정보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진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