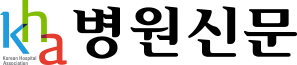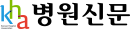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신의 도시"라 불리는 곳은 역설적으로 신이 외면한 듯한 브라질의 빈민가다. 가난과 범죄로 찌든 이곳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꿈꾼다. 총과 마약으로 권력을 장악해 부를 쌓으려는 것. 이들 앞에는 어떠한 도덕도 설 땅이 없다. 정글의 법칙이 있을 뿐.
영화의 원작이 된 파울로 린스의 베스트 셀러 "시티 오브 갓"은 작가가 성장한 곳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려 10년의 집필 끝에 1997년 장편 소설로 발간돼 6개국어로 번역됐다.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은 이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기면서 최대한 원작의 사실성과 충격성을 살리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빈민가 출신의 아마추어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모험을 걸었고, 빈민가의 구석구석을 담으려고 했다. 그 때문에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극 영화의 중간지점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임상수 감독의 "눈물"(2000)이나 장선우 감독의 "나쁜영화"(1997) 처럼 말이다.
영화는 한마디로 무서운 아이들의 생존의 방식에 접근했다. 같은 마을 사람들조차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 부르는 이들 갱단은 성악설을 대변하는 듯 하다. 난무하는 총질 속에 복수는 물고 물리고 결국은 모두가 파멸하고 만다. 그러나 파멸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세력이 샘솟듯 솟아난다.
그런데 이 영화 참 특이하다. 이 모든 과정이 경쾌한 삼바춤처럼 펼쳐진다. 천인공노할 짓들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슬픔을 유발하지만 영화는 스스로의 무게중심을 잡았다. 처절하지만 무거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것. 또 주인공들의 모습 자체가 이러한 분위기를 도와준다. 총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일자무식에 지혜라고는 없는 젊은 혈기들의 즉흥성과 좌충우돌은 자연스레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마련. 덕분에 예상외로 관람의 힘겨움은 없다.
2004년 아카데미상 4개 부문 노미네이트작.
11월 4일 개봉, 18세 관람가.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