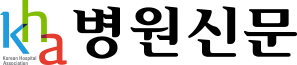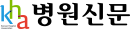병협, 입법예고 검토서 보건복지부 전달
“병상 감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수가보전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우선 입원실의 경우 입법예고의 ‘규제영향분석서’는 감염예방의 취지를 위해 입원실의 병상간 이격거리 1.0m는 비말감염 거리(3피트)를 감안한 최소기준으로 돼 있지만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 0.9m 이격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병상간 이격거리는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지만 벽체와의 거리는 감염관리 예방과 연계하는데는 무리라는 것이다.국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해외사례와 같이 적용하기는 자원 제약이 많다.
신증축 등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도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1.22m, 일본은 1.0m를 적용하고 있음을 예시하면서 1.5m에서 1.2m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병상간 이격거리 적용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전체 약 20% 병상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적 보상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는 정부안인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300병상당 1개’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병실설치에 소요비용이 크고 평시에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반면 해당시설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없거나 적을 수 있어 비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 형태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전염력이 높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사태의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격리해 관리돼야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염병 관리병원 및 국가지정병원의 음압격리병실 수를 집중적으로 확충·관리하기 위해 공공병원 위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에 따라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을 온전히 1개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음압격리병실 다인실도 병상수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약 18.7%에 불과하고 엄격한 시설기준에 따라 일반병상을 폐쇄하고 설치하는 등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단지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병실을 2분의 1로 계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단독배기에 대한 기준 마련시 배기라인이 재순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예외규정 명문화 또는 단독(독립)배기 기준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병원협회는 “국가지정병원은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감염병 환자 입원시 수가로 일부만 보전함에 따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설치비용과 설치 이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환자실에 있어서도 병상간 이격거리를 신증축시 2m에서 1.5m로, 기존시설 1.5m에서 1.2m로 완화하고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의 간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환자실 시설 기준 개정안 적용시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인큐베이터, 신생아베드, 인공호흡기 등 환아 특성상 적용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 손씻기 시설 및 병상간 이격거리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기존시설 개선 의무사항을 2018년 12월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적용할 경우 전체 병상수의 약 20% 감소가 예상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의료인을 포함한 병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해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공포 후 시행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보건복지부는 병원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