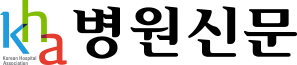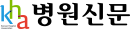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중에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되고 있는 비율은 89.8%로 거의 90%에 육박한다.
의료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던 3대 비급여도 간병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급여화되지 않고 의학적 비급여 형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때 1조5천억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급여 항목은 고가항암제와 MRI 검사, 수술후 장기들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필름인 유착방지제처럼 치료에 필요한 필수적 의료행위와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이나 수술시 연기가 나지 않고 전기소작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초음파절삭기와 같은 비필수 의료행위로 구분된다. 또한 미용·성형 등 미백용 레이저 시술같은 치료와 전혀 무관한 비필수 의료행위도 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비급여 의료비 규모의 증가속도.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급여 의료비 증가율은 13%인 반면, 비급여는 25%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값비싼 신의료기술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다 가격책정이 자유롭고 청구나 심사가 없어 가격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측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보장성을 강화해도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정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선별급여다.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필수적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50∼80%로 높게 책정하고 3년마다 재조정을 통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된 선별급여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언뜻 보면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많다.
최대 80%까지 본인부담을 시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추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자칫 가격만 통제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감안, 선별급여에 따른 가격인하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같은 약속이 지켜진 선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선별급여를 생각하기 앞서 현행 의료행위에 매겨진 수가가 타당한지부터 검토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