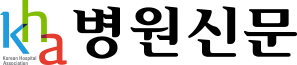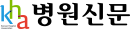추적60분,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눈여겨볼 만

8월2일 방송된 '추적60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현실과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다뤘다.
방송에서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고 당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계적인 조건을 만들어 전공의가 빠지니까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인력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진료공백을 해결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진섭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장은 “과도한 업무의 여분, 잉여분을 맡아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직종을 찾아서 고용하면 병원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보조인력, 인력비를 다 계산하니 1년에 80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적정수가'다.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의료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의 질을 좌우한다”며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도 “지금 필수의료행위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책정돼 있어, 대학병원 전문의가 부족해도 인력을 더 고용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소개했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전문의로서 병동에 상시 배치해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전공의 교육도 담당한다.미국의 경우 1984년 故 리비 자니언 여대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련제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사는 1주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고, 연속해서 근무교대 없이 24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줄어든 진료공백은 '호스피탈리스트'로 메우고 있다. 지금도 전공의의 당직과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최초로 도입한 로버트 왁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때문에 100명의 환자들 중 70명만 진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호스피탈리스트에게 진료를 받고요. 밤에는 세 명의 호스피탈리스트가 밤새 병원에 남아 있으면서 수련의들을 감독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4월 △36시간 연속 초과 수련금지 △10시간 이상 수련간 휴식 △주당 수련시간 최대 88시간 이상 금지 등을 담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 또한 개선안 실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80시간 보다 더 일하면 사유서를 내야하는데, 그거 쓰는 것조차 일이니까 그냥 80시간을 맞춰서 써 내는 거예요. 결국 일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업무강도가 세집니다”
방송에서는 전공의 1,2년차가 당직을 서는 야간과 주말시간에 의료의 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24시간 밀착 취재해 설명했다.
방송 진행자는 “의료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100건을 돌파했다”며 “큰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추진하는 땜질식 의료정책은 병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또한 “의료사고를 막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