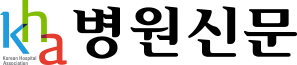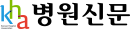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경남 서부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온 ‘103년의 공공의료’ 역사를 마감했다.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남도의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처사로 규정하고, 정상화 촉구 투쟁을 포기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반대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구노력 등 최소한의 ‘회생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빈곤층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 ‘수익성’의 잣대로만 공공의료를 보는 것 자체가 삐뚤어진 시각이라는 논리이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분만이나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지역 거점’ 역할을 맡아온 것도 사실이다.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의 경상운영비(공공의료에 필요한 적자보존비용포함) 보조를 가능케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린 시설·장비 확충 자금 부채는 중앙정부가 청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향후 다른 지방의료원의 거취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곳으로 보인다. 현재 33개의 지방의료원은 몇 개만 제외화고는 진주의료원과 같이 대부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소규모이지만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곳뿐이다.
이들 의료원들도 과거 만성적자에 시달렸지만 기능·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긴축예산 집행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만성적자의 늪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