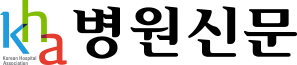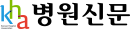병원에서 일을 한 지 2년이다. 어렸을 때 조금 허약했지만 크면서 심하게 아픈 적이 없었고 웬만큼 아픈 건 미련하게 참는 편이었다.
덕분에 동네 의원은 몇 번 가봤지만 지금 일하는 곳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을 치료를 받기 위해 다닌 적은 없었다.
2010년 겨울 이전까지는 꼬마시절 친할머니와 남동생의 입원실로 병문안을 간 것이 대형병원 출입의 전부이었다.
좋아하는 TV 만화영화도 볼 수 없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병실은 정말 싫었다.
하지만 남동생이 입원했을 때에는 어린 마음에 침대에 누워 엄마와 예쁜 간호사 언니의 보살핌을 받고 병문안 온 친척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환자 노릇이 부럽기도 했다.
이런 기억 위에 크게 다치거나 아픈 적이 없었던 건강한 성장과정이 더해져 나는 입원을 약간 동경하고 병의 무서움을 모르며 건강을 당연히 여기게 된 것 같다.
이런 내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것도 암이라는 무거운 질병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업무공간이 진료공간에 있는 관계로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 밖을 나갈 때마다 환자와 보호자를 지나쳤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큰 병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알지 못했다. 심지어 부끄럽게도 병가를 낼 수 있게 몸져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나의 만용과 무지를 깨달은 건 화장실 덕분이다. 업무공간이 진료공간에 있으니 화장실도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얼마 전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들어오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다.
놀란 내가 최대한 빨리 손을 헹구고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처음 멈춘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었다. 다 큰 어른인데도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왜 그리 섧게 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추측'은 할 수 있었다.
그때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아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내 의지대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는 상태로 말이다. 하지만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삶과 건강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일이 너무 많다며 속상해 할 때 누군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글귀가 하나 있다.
그때는 별 감흥이 없어 생각에 남지 않았다. 겨우겨우 기억나는 단어들을 긁어모아 검색을 하니 인터넷이 척하니 찾아 주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누군가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자. 이것이 빙빙 돌아 글의 마지막에야 밝히는 2013년 나의 새해 희망이고 각오이다. 남의 불행에 대어보고 지금 내 처지에 만족하고 위안을 느끼자는 것이 아니다. 많이 갖고 싶어 욕심을 부리면서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내일을 갈망하기보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이 각오를 제대로 지킨다면 내 인생 가장 두꺼운 일기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