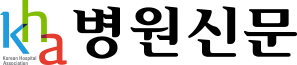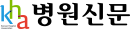자궁근무력증 양막조기파열 등 고령조산 증가
이른둥이 생존율 높아져
강남성심병원 12년간 현황 조사, 더 작게 일찍 태어나
자궁근종근무력증ㆍ양막조기파열 등 고령조산산모 증가
이른둥이들이 점점 더 작게, 더 일찍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생존율은 점차 높아져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성태정 교수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출생한 신행아 1만6천73명 중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극소저체중출생아(1천500g 미만) 339명(2.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1997∼2003년을 Ⅰ기(1만625명 중 149명’, 2004~∼008년을 Ⅱ기(5448명 중 190명)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Ⅰ기에 비해 Ⅱ기 극소저체중출생아 발생빈도는 2.5배(1기 발생빈도 1.4%, 2기 발생빈도 3.5%) 증가했다. Ⅰ기에서는 27.5%(41명)였던 30주 이후 출생아들이 Ⅱ기에서는 17.3%(33명)로 줄었다. 반면 23∼30주까지 미숙아는 72.4%(108명)에서 82.6%(157명)으로 많아졌다. 출생 주수별 분포를 살펴봐도 Ⅰ기에서는 29∼30주에 27.5%(41명)로 가장 많았는데, Ⅱ기에서는 27∼28주에 32.6%(62명)로 가장 많이 출생하는 등 평균 1∼2주 정도 미숙아 출생이 빨라졌다.
출생 시 몸무게로 살펴보면 1kg 미만이 Ⅰ기에 28.2%(42명)였으나 Ⅱ기에는 38.9%(74명)로 증가했고, 1kg 이상은 71.8%(107명)에서 61%(116명)로 줄어들었다. 출생 체중별 분포에서도 Ⅰ기에서는 1250~1499g이 40.9%(61명)로 가장 많았던 반면 Ⅱ기에서는 1000~1249g이 33.1%(6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태정 교수는 “이는 고령산모의 증가로 인해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조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근무력증 산모는 16.8%에서 43.7%로, 양막조기파열 역시 20.1%에서 43.2%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은 미숙아 생존율과 정비례 관계가 형성된다. 재태연령이 짧고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 미숙아 생존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 12년간 추이 분석 결과에서는 Ⅰ기에 비해 Ⅱ기에서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생존율은 59.1%에서 74.2%로 의미있게 향상됐다.
재태연령으로 살펴보면 Ⅰ기에서는 생존아가 없어 0%였던 25주 미만 미숙아 생존율이 Ⅱ기 때는 15.4%로 증가했으며 △25∼26주에서 40.9%(22명 중 9명) → 60.0%(35명 중 21명) △27∼28주에서는 46.1%(39명 중 18명) → 85.5%(62명 중 53명) △29∼30주는 68.3%(41명 중 28명) → 94.1%(34명 중 32명) △31∼32주는 72.7%(22명 중 16명) → 90.0%(20명 중 18 명)으로 늘었다.
출생체중별로도 500∼749g의 경우 Ⅰ기에서는 생존아가 없었으나 Ⅱ기에는 30%(30명 중 9명)로 증가했다. 특히 1000∼1249g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58.7%(46명 중 27명)에서 93.6%(63명 중 59명)로 아주 크게 높아졌다.
성태정 교수는 “극소저체중출생아의 생존율은 신생아 집중치료 수준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생존율의 향상은 그만큼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남성심병원 역시 Ⅱ기부터는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분리, 격리실 신설, 전담간호사 배치, 인공호흡기도입 등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했고, 생존율 향상은 그에 따른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성교수는 “이에 따라 저출산 시대에 미숙아들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를 보다 많은 병원들이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