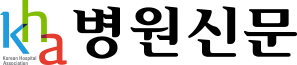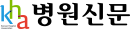정주의학회·밸런스의학회 등 일부 학회 '불만 표출'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연수교육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수평점 신청이 어려웠던 임의학회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평점 신청은 가능해졌지만 불명확한 평가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연수교육 기준을 강화하면서 교육 신청 자격을 △시⋅도 의사회·시군구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인턴수련병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에만 한정적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임의학회는 연수평점 신청자체를 못하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것. 하지만 이러한 학회의 불만을 수용, 연수교육평가단은 임의학회를 심의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평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회가 있다. 이들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기준이 모호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은 "우리 학회는 애초에 평점을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다. 평점을 주지 않아도 회원들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최근에 화두가 됐다. 연수평점 신청을 했는데 통과를 하지 못했다. 우리와 비슷한 임의학회에서는 평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곳의 프로그램이나 아젠다를 봐도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정주의학회가 연수평점 심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지난 2월28일 진행된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600여 명의 회원들은 연수평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학회는 앞에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평점을 받았었다.

유 회장은 "우리 학회도 연수평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강의를 들으러 온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연수평점 신청을 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모호하다. 심의비(50만원) 책정기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심의위원회에 있는 모 단체 회장과 친분이 있는 학회들이 다 연수평점을 얻었다는 것이다. 의협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뒷짐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후 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 본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학회의 불만과 달리 연수교육 심의위원회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월28일 열린 비만연구의사회에는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에서 직접 나와 연수교육 계획 신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김나영 평가단 운영위원장(의협 학술이사)이 제시한 '연수교육 계획 신청승인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평가단은 △연수교육 장소 적절성 여부 △상업적 연수교육 여부 △교육기관 분류에 따라 주최기관 및 하부기관으로 적절성 여부 △연수교육 강사 적합성 여부 △교육주제와 교육내용의 적합성 여부 △강의시간과 희망평점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정주의학회나 등이 평점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교육주제와 교육내용을 적합성 여부'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 항목에는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 식품 등 보완대체 요법 관련 교육은 불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나영 위원장은 "정주의학회는 대체의학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의 문제도 있었고 3년 동안의 학회 실적에 대한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또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강의를 하는 연자는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에 평점을 받지 못한 학회도 추계학술대회 때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다시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서 "의협은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회원들에게 패널티를 줄 이유가 없다"라며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