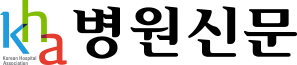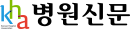9월15일 서울 시네큐브에서 단관 개봉되는 "랜드 오브 플렌티(Land of Plenty)"는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던 작품.
"파리,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밀리언 달러호텔"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필모그래피 가운데 가장 사회성이 두드러진 소재의 작품이지만 특유의 몽환적인 화면과 감미로운 선율은 여전하다.
주인공 폴(존 딜)은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테러로부터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아래 첨단 추적장치를 장착한 밴을 타고 LA 거리를 오가며 수상쩍은 사람들의 행동을 카메라로 감시하고 이들의 동태를 녹음기에 담는다.
그런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라나(미첼 윌리엄스)가 찾아온다. 선교활동을 하는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를 여읜 뒤 외삼촌을 찾아 이스라엘에서 LA로 건너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한다.
핏줄이라는 관계 말고는 성장 배경과 가치관이 전혀 달라 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한다. 그러던 중 한 중동인이 피살된다. 희생자는 폴이 위험인물로 점찍어놓았던 인물. 폴은 피살자의 배후 추적에 나서고 라나는 피살자의 가족에게 시신을 전달해주기 위해 외삼촌을 돕는다.
피살자의 고향인 트로나까지 찾아온 두 사람. 그곳에서 폴은 그동안 지녀온 망상의 실체와 맞닥뜨리며 혼란 상태에 빠진다. 라나는 9ㆍ11 현장인 뉴욕으로 함께 차를 타고 가며 폴의 상처를 쓰다듬어준다.
9ㆍ11 사태를 뒤집어보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점에서는 "랜드 오브 플렌티"나 "화씨 9ㆍ11"이나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접근 방법은 판이하다. 빔 벤더스는 마이클 무어처럼 냉소적이지도, 선동적이지도 않다. 9ㆍ11 전후 사태의 이면에 가려진 음험한 커넥션을 들춰내며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기보다는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의심받는 평범한 중동인이나 과잉 애국심에 시달리는 미국 서민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든다.
"풍요의 땅"이라는 뜻의 영화 제목은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화 도입부에 깔린 "승리하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멈추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내레이션은 이 땅의 풍요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나를 마중나온 목사는 "LA가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며 "아무도 미국의 빈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라나가 "기자는 없는가"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다 이라크로 가버렸다. 아니면 다른 기사거리를 찾고 있거나."
묵직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어 머리는 다소 무거워지는 느낌이지만 로드 무비 형식으로 담아낸 서정적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은 즐겁다. 사막 속의 작은 도시 트로나의 풍경, 실루엣으로 펼쳐지는 LA와 뉴욕 마천루의 스카이라인 등은 오랫동안 망막에 남는다. 음유시인 레너드 코언, 천재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 등의 음악도 귀를 즐겁게 만든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