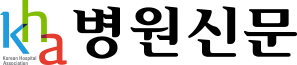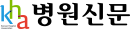59%가 콜레스테롤 조절 안돼
국내 고지혈증 환자 10명 중 6명은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목표치까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지 못해 "선진국 전염병"으로 불리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의대 순환기내과 김효수(金孝洙, 46세) 교수는 전국 병·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평균 57세의 남녀 고지혈증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치료현황을 조사한 "REALITY"(Return on Expenditure Achieved for Lipid Therapy) 연구결과 전체환자 중 41%만이 LDL(저밀도)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들 중 관상동맥질환자 및 당뇨병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 보유군의 치료성적은 더욱 낮아 이들 중 37%만이 치료 목표치에 도달했다.
특히 치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의 34%가 목표치보다 30% 이상 높은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여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각 위험군에 따른 치료 목표치 달성 정도는 ▲1개 이하의 위험인자를 지닌 저위험군의 경우 68% ▲2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지닌 고위험군에서는 37% ▲관상동맥질환자의 경우는 18%의 목표 달성률을 보여 고위험군에서 목표 달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93.8%는 초기 치료약제로 "스타틴"(Statin) 계열의 약물을 처방 받았다.
김효수(金孝洙)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지혈증을 포함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사정은 반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흡연 등 위험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고지혈증치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현재 국내 처방 및 진료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의 지침이 총 콜레스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치료시점 권고치 또한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발표된 美 국립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NCEP)에 따르면 약물치료가 필요한 LDL 수치를 심활관질환 고 위험군의 경우 기존의 100㎎/㎗에서 70㎎/㎗로 낮춰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공식을 실제 치료에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식, 채식, 저염식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이상적 체중유지, 금연, 긍정적 사고 등의 생활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마른 사람이나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고지혈증환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75회 유럽동맥경화증학회에 발표됐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전염병"(epidemic of the developed country)으로 불리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연간 1천670만명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불과 10여년 사이에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0명에서 2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한국인의 콜레스테롤 평균수치는 10년마다 10mg/dl씩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mg/dl 올라갈 때마다 심장병의 발생위험은 최대 2∼3%까지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사망률 1위는 암(25.9%)이지만 심혈관계질환의 사망률을 합하면 암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위인 뇌혈관질환(14.8%), 3위인 심장질환(7%), 4위 당뇨병(4.9%), 9위인 고혈압(2.1%) 등 심혈관의 문제로 사망하는 질병을 합하면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