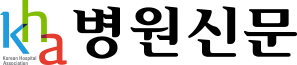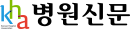실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영화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옮겨 전달하려 함으로써 극영화로 분류하기에도 모호하다.
1967년 서독. 이란의 전제 군주 방문을 반대하는 한 집회에서 대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과격해진다.
바더(모리츠 블라이브트로이)는 동료와 함께 사람이 없는 백화점에 불을 지르고, 좌파 언론인인 마인호프(마르티나 게덱)는 이들을 옹호하고 나선다.
마인호프는 바더의 애인이기도 한 앤슬린(요한나 보칼렉)을 감옥에서 인터뷰하고, 항소 과정 중 도망쳤다가 다시 철창에 갇힌 바더의 탈옥도 돕는다.
그러면서 영화 제목이기도 한 "바더-마인호프" 그룹이 탄생한다.
이들은 은행을 털고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서 훈련을 받고는 미군 기지와 경찰서, 보수 언론사와 판사의 차량을 폭파한다.
결국, 하나둘씩 경찰에게 붙잡혀 옥살이를 하던 이들은 단식 투쟁으로 저항하다가, RAF 2세대들이 자신들을 구하려고 벌인 여객기 납치 사건이 실패하자 모두 자살한다. 1977년 가을의 일이다.
원작인 슈테판 아우스트의 책 "신화의 시간(Der Baader Meinhof Komplex)"처럼 영화도 객관적인 관점을 철저하게 지킨다.
꿈과 이상에서 출발한 "바더-마인호프"의 싸움이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로 치닫는 과정을 전하면서 사건을 과장하지도, 등장인물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감정을 이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물든 1970년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시절이었는지를 2시간30분간 소름끼치도록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울리 에델 감독이 독일 역사상 최대 제작비인 2천만 유로(약 355억원)를 들여 만들었다.
23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