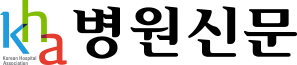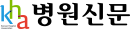영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은 최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는 도르지의 고향마을 자르코트를 향해 걷는 척박한 길만큼이나 웃음기가 없다.
영화 초반 최가 자르코트로 향하는 여정이 20여 분간 계속된다. 카메라는 양복을 차려입고 짐을 진 셰르파의 뒤에 한참 뒤처져 걷는 최와 거리를 두고 앞에서, 뒤에서 그를 비춘다. 대사도 음악도 없고, 들리는 것은 거센 바람 소리와 가쁜 최의 숨소리뿐이다.
지대가 높아질수록 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한다. 결국 쓰러진 그는 말 등에 얹혀 도르지의 집에 도착한다.
여행은 도르지의 유골을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는 도르지가 남긴 돈만 건네고 도르지는 "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최의 여행은 그저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도르지의 어린 아들과 영어로 나누는 짧은 대화 말고는 최가 그곳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도 없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이방인인 최에게 술을 따라주고, 병이 난 그를 보살펴 준다.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검은 땅의 소녀와" 등의 작품으로 국제 영화제에서 더 주목받은 전수일 감독의 여섯 번째 장편이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파고드는 그의 작품은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 묵직함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힘겹게 지나온 시간의 끝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최민식은 영화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배우로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히말라야의 풍광은 서정적이면서도 압도적이다.
6월11일 개봉. 관람등급 미정.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