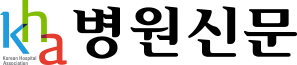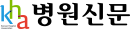환자가 포기하지 않는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고마웠고, 앞으로 건강하고 조카들 잘 부탁한다.”
“아이고, 형님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무슨 그런 말씀을...건강 괜찮으세요?”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좀 안 좋다네.”
“어이구 형님 얼른 건강해져서 나오세요.”
“그래 고마웠다.”
오랜만에 전하는 안부 전화인지 마지막 전화인지 알 수 없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듯이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전화를 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앉아서는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밥 먹는 상에 이불과 베개를 덧대어 기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침대 맡 모니터에서는 산소포화도가 널뛰기를 하며 나에게 연신 빨간 등을 띄우며 경고를 해온다.
“괜찮으세요?”
“네. 산소포화도가...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면 나 조금만...더 앉아있어도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산소포화도가 오른 후에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인공호흡기를 달지 알 수 없어 그의 안부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알 수 없는 전화를 막을 수 없었다. 그의 폐는 그와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물에 적신 것처럼 하얗기만 했다. 그 누구보다 그가 했던 노력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전화가 더 구슬프게 들리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면서 너무 사람들을 못 챙겼어...그게 너무 아쉽네. 지금이라도 전화하려고...혹시 내가 잘못되면 정리해야 될 것도 있어서...아내랑 딸에게도 알려줘야 해...”
그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을 말하듯 ‘이제까지 고마웠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느낌의 ‘빨리 건강해져서 퇴원해.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을 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래그래’라고 답변하며 서둘러 전화를 마무리했다. 흐르는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은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지 한 장을 툭 뜯어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안 힘드세요?”
“괜찮아... 참을만...해”
하지만 누가 봐도 그는 힘들어 보였다. 갑자기 휙 하니 작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든 숨을 쉬면서도 그는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감당해 내고 있었다.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마지막인 듯 전화를 하는 그가 자신의 상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까 봐, 혹시 지금 포기를 한 것일까 봐, 마음이 과식을 한 것처럼 체한 듯 했다.
“환자분 포기한 거 아니죠? 아니 포기하면 안 돼요.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할 거에요.”
그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방향성을 잃은 말에 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격리구역을 나와서도 나는 주치의를 붙잡고 내가 봤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해서 전달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주치의에게 전해졌을까.
이 시기 나는 일을 그만둬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 6개월 전쯤 코로나 치료를 하던 환자가 병실을 나가겠다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 그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졌고, 환자는 고의적으로 나의 보호구를 벗겼다. 처음에는 벗겨지지 않으려 보호구의 후드를 얼굴에 밀착시켜 꽉 잡고 발버둥을 쳤다.
머리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초 단위가 무색할 만큼 스쳤다. 그 찰나에 도망가는 환자를 보고 나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니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막아섰다. 그러자 그는 내 목을 잡고 이리저리 휘둘러댔고 나중에는 목을 휘어 감고 문을 열라며 협박을 했다. 환자는 나를 포함한 3명의 간호사의 보호구를 벗겼고, 우리는 갑작스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다. 언제든지 갑자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해 버렸다. 부서이동을 권유하는 파트장님께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서면 절대 임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나는 이 일에서 벗어난 듯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집에 보내주던지, 인공호흡기를 꽂아 주던지 둘 중에 결정해”
“두 개 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주치의 언제 오는데, 이거 다 제거해 줘. 나 나갈 거야.”
“격리 중이어서 못 나가요. 그리고 저는 제거 못해드려요.”
엎드려있는 치료적 체위가 힘들다며 자의 퇴원서를 쓰고 집에 가겠다고 몇 분마다 불러서 협박을 하는 환자가 있었다. 6개월 전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환자가 저렇게 말할 때마다 지난날 기억이 떠오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내 반응이 속상해서인지 자꾸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환자가 힘들어서인지 결국 참다 참다 울음이 터져버렸다. 격리구역 안에서 보호구를 입고 있어 닦을 수도 없는 눈물이 뺨을 스쳐 비를 내렸다.
이런 속상한 나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건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환자 옆에 마지막을 직감하듯 안부전화를 거는 환자였다. 하루종일 엎드려있어야 하는 치료적 체위가 힘들어 보여 잠시 옆으로 누워도 괜찮다고 말해도 힘들지 않다며 노력하던 환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언제까지 임상에 있게 될지는 모르겠다. 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되는 것까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때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언젠가 올 이별이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