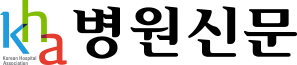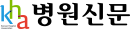김헌주 정책관 "의료전달체계 가능한 올해 개선 마칠 것"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서 단순히 의사만을 늘리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 의사 분포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은 7월 24일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임태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공동 주최한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과 의료제도’ 온라인 공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자신의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홍 단장은 “제가 의사 수 추계를 2060년까지 했다. 장기추계 이유는 인구는 줄고 있지만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고 의료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언제 그 수요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계를 길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단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추계를 믿지 못하는 상황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는 합리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의사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 수 증원은 의사 분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 단장은 “모든 분들께서 분포를 이야기 하는데 분포는 전체적인 균형이 제로라고 해도 불균형 분포인지는 알 수 있다”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같은 대도시는 의사 수가 2035년에는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단장은 “서울만 해도 거의 1만명 정도가 과잉이고 대도시 중 인천과 울산은 부족하고 나머지 도시 역시 매우 부족하다”면서 “결국은 필수의료에 있어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인력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접근성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는 홍윤철 단장은 “풀뿌리에 있는 기초단위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원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지역에서의 민간의료와 결합해서 공공의료가 협력체계를 이루는 민관협력의료체계가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이 배치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일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준비한 내용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관은 “분명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일단은 400명 수준으로 늘리면서 이 정원을 10년간 유지할 것으로 계획을 잡은 만큼 중간에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고 의료전달체계는 가능한 금년 중에 개선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대정원 확대에만 매달려 있다는 정부 비판적인 의견도 개진됐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육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선행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의대정원 확대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면서 “포퓰리즘적으로 정치권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병원계와 의료계도 함께 싸잡아 비판했다.
왕규창 교육위원장은 “병원협회는 의사 구인난 해결에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의사협회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였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파업을 이야기 하는데 파업이야기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로 볼 것”이라며 반대했다.